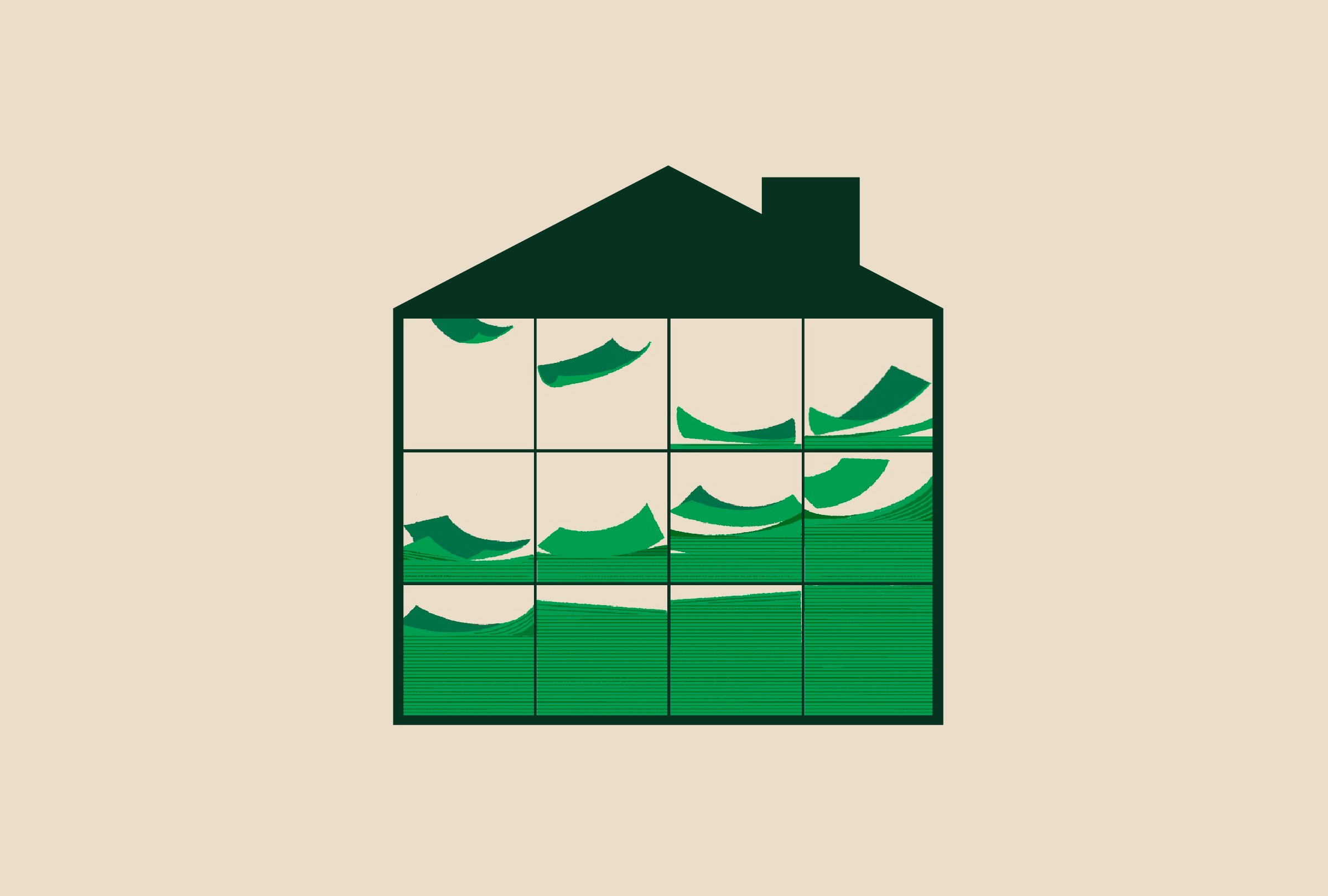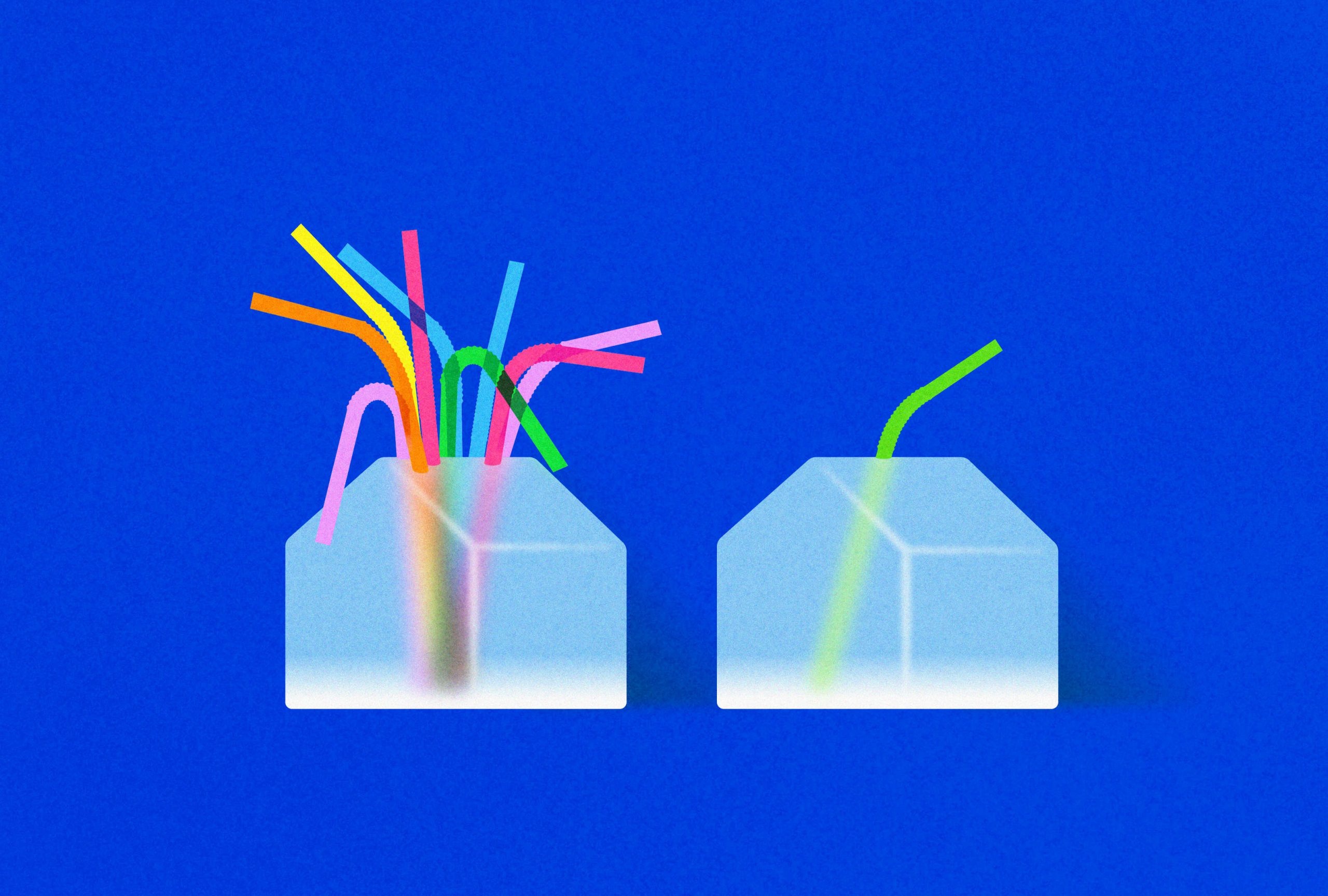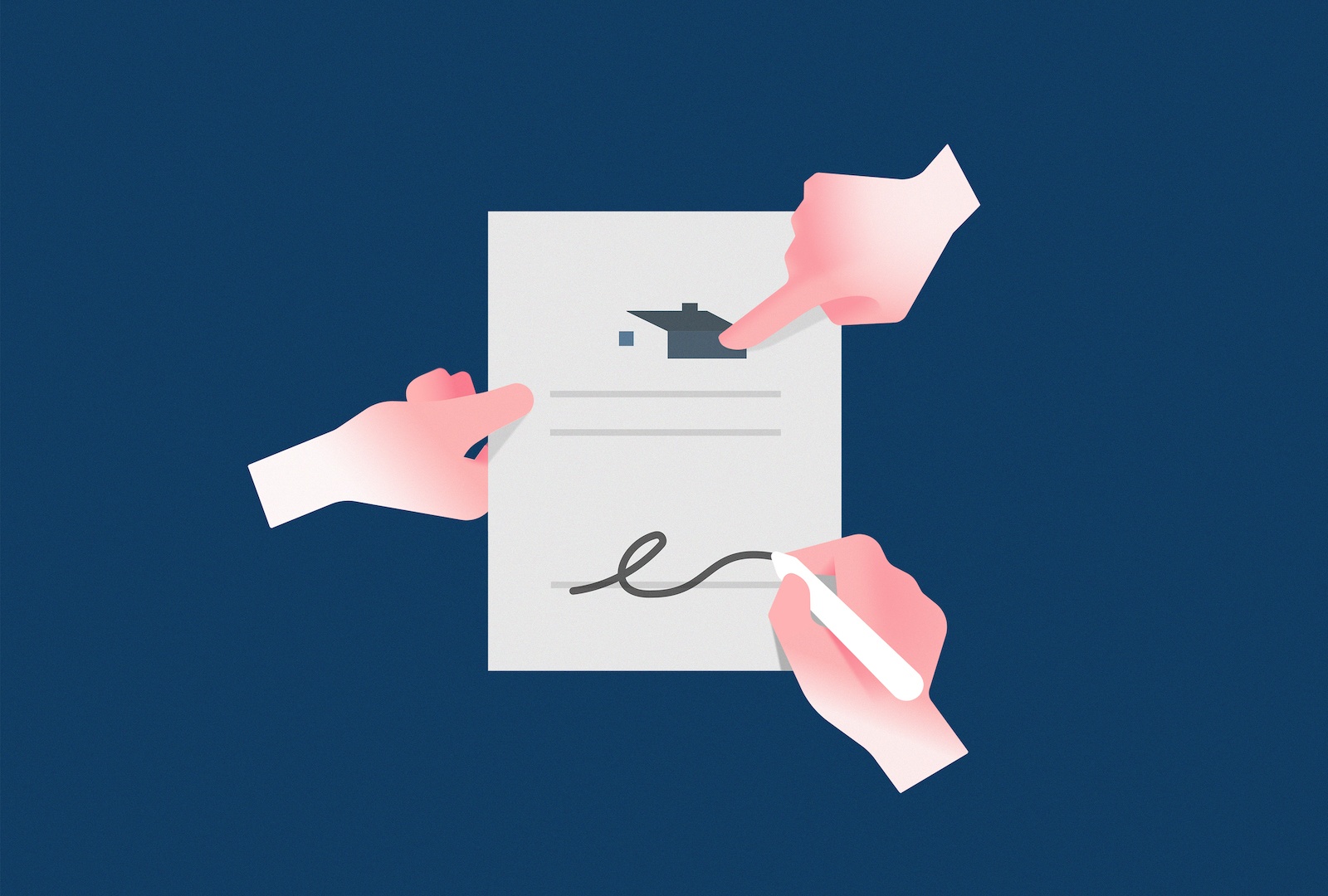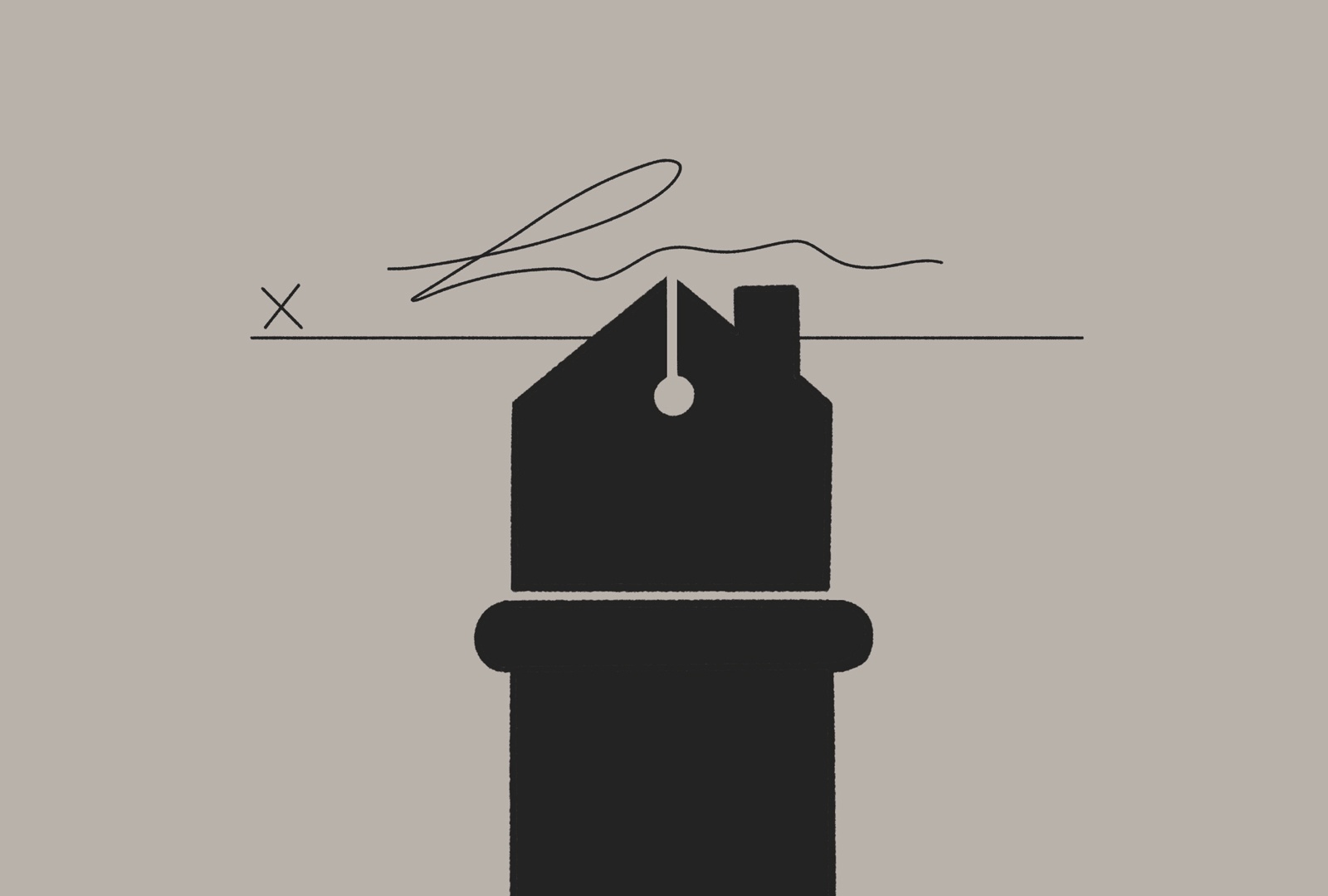보증금 지키기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 법
ㆍby 썸렛
Q. 처음 독립하면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, 보증금을 잘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돼요.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
등기부등본 보는 법 알면 내가 빌려 살 이 집이 안전한지,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.
등기부등본은
집 주인이 누군지, 압류될 위험은 없는지,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등을 상세하게 적어 놓은 장부예요.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.
등기부등본은 아래 이미지처럼 생겼어요.

어려운 말도 많고 간간이 빨간 줄도 그어져 있어서 처음 보면 당황할 수 있는데요.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
등기부등본의 구성
크게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구성돼요.
- 표제부: 부동산에 대한 정보, 주소, 건물번호 등을 나타내요.
- 갑구: 누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지(=소유권)에 대해 적혀 있어요. 가압류,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.
- 을구: 소유자에 대한 정보 외의 다른 정보들을 보여줘요.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받았는지(=근저당권) 등도 을구에서 알 수 있어요.
계약할 때라면 표제부를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하지만, 계약하기 전이라면 갑구와 을구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.
+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미 지나간 내용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.
1. 갑구에서 이런 단어가 있다면 위험해요
- 가등기: 집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예정이라, 집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예요. 소유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, 직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.
- 신탁: 집 주인이 형식적인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대출을 받은 거예요. 이 때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돌려받는 순위가 밀릴 수 있어요.
- 압류&가압류: 집주인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법인이 돈 대신 이 집으로 돌려받겠다고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‘압류’ 또는 ‘가압류’가 찍혀요. 그만큼 집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.
- 경매개시결정: 집주인이 돈을 못 갚은 나머지,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.
- 임차권등기명령: 앞서 집을 빌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걸 말해요. 이 단어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
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,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적혀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해요. 문제가 생기더라도 “넌 알고도 들어갔잖아”라면서 법적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.
2. “융자+보증금 < 집 시세의 70%” 공식을 기억해요
집주인은 집을 살 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요.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 ‘근저당권 설정’이라고 적혀요. 돈 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, 지나치게 큰 돈을 빌렸다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
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부동산이 시세보다 낮게 팔릴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.

집주인이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보려면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에서 오른쪽에 있는 ‘채권최고액’을 보면 돼요.
채권최고액은 보통 대출금액의 120~130%를 뜻하는데요. 위 그림과 같이 6,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약 5,000만 원을 빌렸다고 볼 수 있어요.
그렇다면 얼마까지 빌린 걸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전문가들은 빌린 돈(융자)와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의 70% 미만일 때 안전하다고 봐요.
- 융자: 등기부등본에서 을구 ‘채권최고액’을 통해 알 수 있어요.
- 보증금
(1) 다세대주택: 내 보증금만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.
(2) 다가구주택*: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합해서 계산해야 해요.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는 중개사에게 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’를 달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. *다가구주택: 주인 1명이 건물을 통째로 소유해 여러 호실을 관리하고 있는 구조
등기부등본 보는 법, 예로 설명해보면요
다음과 같은 다세대주택이 있어요.
- 시세: 2억 원
- 근저당권 설정의 채권최고액: 6,000만 원
- 보증금: 1억 원
융자(5,000만 원)와 보증금(1억 원)을 합친 금액(1억 5,000만 원)이 시세의 70%(1억 4,000만 원)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보긴 어려워요.
마지막 보호 장치, 전세보증보험
등기부등본으로도 확인하지 못한 위험 요소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‘전세보증보험’에 가입하는 걸 추천해요. 만약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위험한 집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.
이 경우, 계약하려는 집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잃는다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추천해요.
Edit 송수아 Graphic 이은호
–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.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, 토스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.
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서류, 토스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
슬기로운 투자자를 위한 써머리 레터, 썸렛입니다. 매주 월요일, 꼭 알아야 할 뉴스는 물론 현직 기자의 인사이트와 부동산 임장기, 깨알 재테크 정보까지! 투자에 대한 (거의) 모든 걸 전해 드려요.
필진 글 더보기